"플랫폼 기술을 통해 약 8조원 규모 계약"
다양한 후보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천기반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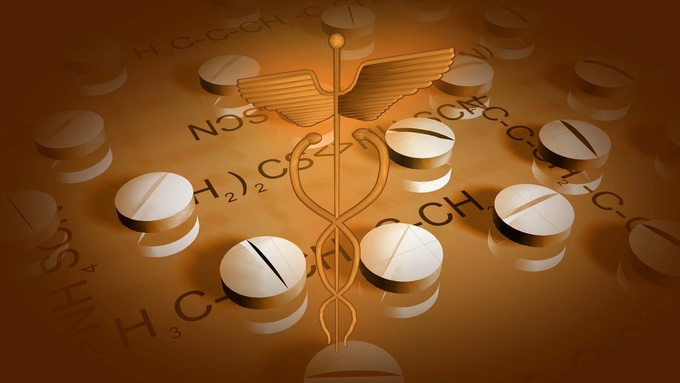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지난해 초 기준, 미국의 한 바이오벤처 기업은 6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정확히 1년뒤 이 기업의 매출은 27억달러로 집계돼 1년 만에 200배가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낸 ‘모더나’의 사례다. 올해 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모더나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117억 달러에 달하는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계약금으로 이미 27억 달러(한화 약 3조원)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단 1년만에 개발됐다. 기존 신약의 경우 임상 기간을 포함하면 평균 10년 정도가 걸린다. 어떻게 시간을 줄였을까. ‘플랫폼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
기존에 개발된 백신 제조 기술에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 유전 정보만 바꿔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플랫폼 기술은 이처럼 약물과 전달체를 합치거나 약물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플랫폼 기술만 있으면 같은 약물로도 여러 신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 같은 기술은 수출도 가능해 수조원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플랫폼 기술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 독감백신과 유사하나 형태의 정기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기술 개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 당국의 실무자이자 동시에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더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mRNA 백신 등 신약 플랫폼 기술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플랫폼 기술 개발 “매출 상승 유인할 새로운 먹거리”
GC 녹십자랩셀, 한미약품, 종근당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6곳은 플랫폼 기술을 통해 총 13건의 성과와 약 8조원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등 주요 성과를 이루었다.
신약개발회사 레고켐바이오(레고켐)는 지난해에만 ADC(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과 관련해 4건의 기술을 수출했다. 계약 규모만 1조 5000억원이다. ADC는 항체, 링거, 약물로 구성되는데, 약물에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붙이고 링거로 연결하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다. 쉽게 말해 일종의 ‘유도 미사일’이다. 즉 ADC가 암세포만 골라잡아 공격하도록 개발한 기술이다.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기존의 항체 의약품들은 대부분 약효가 약하다”며 “말 그대로 폭탄이 아니고 몸에 있던 항체인데 개량을 해서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ADC라는 개념은 항체 폭탄을 달아 약효를 더욱더 세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유럽, 미국 항체 기업들이 우리와 일하고 싶어 하고 있다. 논의 중인 항체 기업들이 많아서 기술 수출 건수가 향후 6개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알테오젠은 정맥주사를 피하주사 형태로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피하주사는 인슐린처럼 환자가 혼자 주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는 총 3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달성했고, 최대 6조 4000억원 규모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내 추가적인 대규모 후속 계약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종근당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희소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병과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신약들도 개발 중이다. 한미약품은 주사용 항암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기술, 단백질 의약품의 약효를 지속시키는 기술 등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암 환자의 백혈구 감소를 막는 바이오 신약 개발에 적용됐다.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플랫폼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은 신약개발 회사가 많고, 외국의 사례로 보면 미국의 경우, 큰 의료기기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술의 경우 신약 개발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신약 개발사가 대부분인 한국 제약 시장에 몰려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물론 외국 제약사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개발 기업이 다수인 국내의 플랫폼 기술은 외국 기업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이 점이 K바이오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약개발 및 플랫폼 기술 등에 쏠린 국내 제약사의 리스크 또한 크다는 지적이다.
이혜린 KTB증권 이사는 "미국은 의료기기나 진단 등 비중이 고른 데 비해 현재 한국의 바이오기업은 신약 개발에 편중돼 있다"며 "신약 개발로 쏠린 부분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플랫폼 기술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후보물질을
이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의 복용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제약바이오업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2등 주자는?…"임상 비용 문제 상존"
- [제약바이오업계] 이낙연 "토종 백신 치료제, 개발만 하면 사겠다"
- [제약바이오업계]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 7곳 "러시아 백신 생산위한 컨소시엄 합류"
- [제약바이오업계] 제약기업 브랜드평판 2위 "삼성바이오로직스", 1위는?
- [제약바이오업계] 수출액 17개월 연속 증가…진단키트, 연간 30억 달러 수출
- [제약바이오업계] CEO 대거 교체하나?...내달 임기만료 '주요 제약사'
- [제약바이오업계] '1조 클럽' 총 12곳…"셀트리온 1위"
- [속보] 국내 제약사 5곳, '코로나 백신 임상진입'
- [제약이슈] 백신 필수 성분 'LNP',에스티팜 확보...2세대 백신 개발도 가능?
- [백신논란]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V, 좋은 대안 될까?
- 윤건영 “이재용 백신용 사면? 이럴 때일수록 원칙 흩트리지 말아야” 반대 뜻
-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백신 지자체마다 잘 맞도록 행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백신이 경제고, 백신이 금융"
-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6차 경제포럼] 정진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코로나 위기도 안보문제...국민의힘, 백신 스와프 시도 제안해"
- [대정부질문] 모더나 백신 상반기 못 들어와…홍남기 “하반기 들어올 예정”
- [대정부질문] 홍남기 "상반기 백신 1200만명분 공급 가능할 것"...정진석 "백신 접종률 100위권 밖"
-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던 40대 여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 백신 접종 주사기서 '혼방섬유' 이물 발견... 두원메디텍 제품 전량 수거 중
- 백신 접종 LDS 주사기서 이물질 발견, 보건당국 "70만개 수거 중"
- [바이오이슈] 잇따른 제약바이오업계의 시총 하락세, 업계 "바이든 수혜주, '바이오시밀러' 집중해야"
- 정 총리 "중대한 한 주가 될 것"…SK바이오 방문, 백신 유통현황 점검

